Ⅰ. 서론
국제개발협력의 진화하는 환경은 점점 더 민간 부문의 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PS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가 및 지역 간 상호의존성이 점증하면서, 복잡한 개발이슈와 인도적 위기는 다층적인 해법을 요하였고, 각 개발주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여 개발협력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협력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손혁상 외, 2019).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민간 부문 참여 확대가 주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2; 김은주·이도석, 2022; 이지선 외, 2023).
개발협력사업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i) 개발재원의 확대, (ii) 위험부담의 분담, (iii) 기업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개발재원의 효과성 및 효율제고 등이 있다(김상훈·임소영, 2020). 따라서, PSE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핵심활동을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하여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혁신이 개발협력과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OECD, 2016a).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을 포함한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에서는 민간 부문의 재원, 기술력, 전문성을 활용한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 가능한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민간이 개발협력의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정부예산 중심의 개발협력 재원 공급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재원 활용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기업의 혁신적 기술 및 글로벌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연계하여 ODA의 경쟁력 제고 및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것을 전략으로 내세웠다(관계부처합동, 2021). 또한,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민간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제 4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업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민간 부문 참여전략’을 마련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2).
본 연구의 분석 사례가 되는 UN(United Nations)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등 국제개발 담론을 이끄는 주요 주체로서, 경제 및 사회 발전, 인권, 평화와 안보, 인도적 지원, 기후 변화 등 국제적인 긴급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Global Compact Office, 2008). 특히나, 최근 공여국들의 ODA 규모가 정체되는 가운데,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은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UN Agenda 2030)와 SDGs의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협력 사업에서 민간 부문 참여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참여는 기대만큼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민간 부문 참여와 민간재원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두 주체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실현하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지금까지 공공부문이 주도해오던 개발협력 사업에 민간 부문이 참여하게 되면서, 각 주체의 근본적인 개발협력 참여 동기가 상이하거나, 각 기관의 사업 운영방식의 차이에 의해 협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적인 제약 요인 극복(관계부처합동, 2022) 및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 부족, 낮은 법·제도적 접근성(이지선 외, 2023)이라는 부분 또한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민간 지원 및 지원방식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 및 보완, 추진체계 정비를 추진하는 전략 수립을 계획한 바 있다(관계부처합동, 2022). 또한 지금까지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사업 참여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및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차원에서(김성규, 2014), 또는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실행 차원에서(김효정, 2022) 논의되어 왔으나, 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체계가 부족하며 정부-기업 간 공식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기업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등 개발협력에서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관계부처합동, 2022).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내 UN-민간기구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주체인 UN 기구를 사례로 하여, 개발협력사업에서 민간기업의 협력 수요와 비활성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개발협력 사업에서 민간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인 UN 기구는 한국 주재 UN 사무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 및 국가 사무소 또한 본부의 전사적 글로벌 PSE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론적 배경 내 UN-민간기업 협력 사례는 국내 사례로만 한정하지 않고,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민간 부문 참여(PSE), 민간 부문 협력(Private Sector Collaboration, PSC), 민간 부문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PSD) 등이 있으나,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PSE로서, 이는 ‘개발 성과를 위해 민간 부문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수반하는 제반의 활동들’을 포괄한다(이지선 외, 2023).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민간 파트너십의 유형과 이에 대한 논의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으며(오수현, 2015), 크게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김은주·이도석, 2022). 초기에는 ‘민간 부문 개발(PSD)’의 관점에서 민간 부문을 개발의 목표 및 대상으로 인식하였으나, 이후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주체로서 인식하는 시각(private sector in development)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민간 부문 참여가 중요해지면서 최근에는 상업 활동을 넘어 국제개발협력 본래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강조하는 시각(private sector engagements through development)으로 전환되어 왔다(김은주·이도석, 2022).
특히, 아디스 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과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은 개발재원 확대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SDGs의 수립은 민간기업을 보다 중요한 파트너로 보는 ‘민간 부문 참여(PSE)’의 논의를 가속화시켰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논의가 확산되면서, 민간 부문 주체들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이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며, 점점 더 많은 민간 행위자가 장기적인 사업 지속성 및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성과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UN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채택 및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출범 이후, UN은 국제 경제 및 사회 발전, 인권, 평화 및 안보, 인도적 지원, 환경 등 긴박하게 직면해 있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로서,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Office, 2009). 기업 및 UN의 궁극적 목표는 각기 다를 수 있으나, 두 주체 간에는 시장 구축, 부패 방지, 환경 보호, 식량 안보강화, 사회 포용 등 많은 공통 목표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Framework for business engagement with the United Nations(2008)” 및 “Guidelines on a principle- based approach to the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business community(2009)”와 같은 전략 문서 수립을 통해 효과적인 민간 부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UN이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유형은 <표 1>과 같다. 가장 전통적인 형식은 UN 기구의 기존 사업 모델에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이다. 재정지원의 경우 상환이 필요한 재정지원(finance)와 단순 기부(grants/donations)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UN 기구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하기 위해 기부의 형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부에는 순수한 자선 기부, 핵심 비즈니스 관련 기부 또는 기타 기부(예: 직원 자원 봉사 프로그램)가 포함된다(Grant, 2013). 예를 들어, UNHCR의 이케아(IKEA)와의 협력에서 이케아는 2010년부터 UNHCR에 약 1.6억 달러 가까이 기부해오고 있으며, 이 파트너십을 통해 난민들에게 대피소 및 쉼터(shelter), 생필품, 교육 등을 제공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원 및 기부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업과의 협업 방식 또한 점차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기업의 핵심 가치(비즈니스) 창출의 개념에서 참여하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이효정, 2016).
출처: Grant(2013), OECD(2016b)를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다음으로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은 개인, 단체 또는 수원국이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직업훈련, 컨설팅 등을 포함한 역량개발의 모든 종류를 포함하며, 주로 전문가를 파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비슷한 방식의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형태 또한 조직이나 민간기업 사이에서 경험이나 모범 사례를 서로 배우는 학습 중심의 활동이며, 개발도상국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이나, 도구,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공유하는 방식을 일컫는다(OECD, 2016b). 정책대화(policy dialogue)는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고 업계 표준을 설정하는 등과 같은 기업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국제, 국가 및 지역차원의 정책 의제 및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16b). 정책대화의 주요 결과로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계획하고, 글로벌 개발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파트너십이 구축되기도 한다. 역량개발, 지식공유, 정책대화 형태의 PSE는 민간기업에게 있어 재정적 리스크가 가장 낮은 형태의 협업방식이며, 동시에 PSE 참여로 인한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UN-민간 부문의 협력유형들은 국제기구와 민간기업이 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SDGs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UN 기구 단독으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효과성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반대로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재원, 기술적 역량 만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여전히 우리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는 입찰을 통한 개발협력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일부 ODA 시행기관(KOICA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 EDCF PPP 사업 지원 등)에서 민간기업과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나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2). 따라서, 민간기업과 함께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의 협력 유형이 더욱 다양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은 기업의 개발협력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Ⅲ. 분석틀 및 방법론
UN에서는 기존의 ‘정부-기구-시민사회’와의 협력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민간기업과 함께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환경·기후변화 및 식량과 같은 분야는 전문 기술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UN 기구들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순한 제품 조달 방식을 넘어서, 기업의 혁신기술·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UN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협업 방식을 모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여전히 여러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UN 기구와 민간기업 간의 활발한 파트너십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개발협력 사업의 주체, 즉 행위자의 ‘동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 주목하였다. 개발협력분야에서는 민간기업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결정을 하기까지 이들 내 작동되는 동기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이지선 외(2023) 연구에 따르면, 개발협력 부문에서 공적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동기’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참여 동기가 협력의 형태와 수준, 그리고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UN과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수익 창출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이에 기여하는 것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김혜경, 2009). 또한 기업은 시장진출 기회 확대, 자원·자본에 대한 접근성 확보, 혁신 기회 창출, 국제 표준 및 정부 규제 준수 등과 같은 다양한 동기로 인해 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다(이지선 외, 2023). 즉, 민간기업은 수익 창출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책임에 기여할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개발협력 사업에의 참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기는 SDGs 달성과 같은 공적 목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 주체의 목적 및 동기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개발협력사업 내 PSE가 제한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UN-민간 부문 파트너십의 한계 요인을 파악하여 UN 기구와 민간 부문이 각각 개발협력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개발협력 분야의 PSE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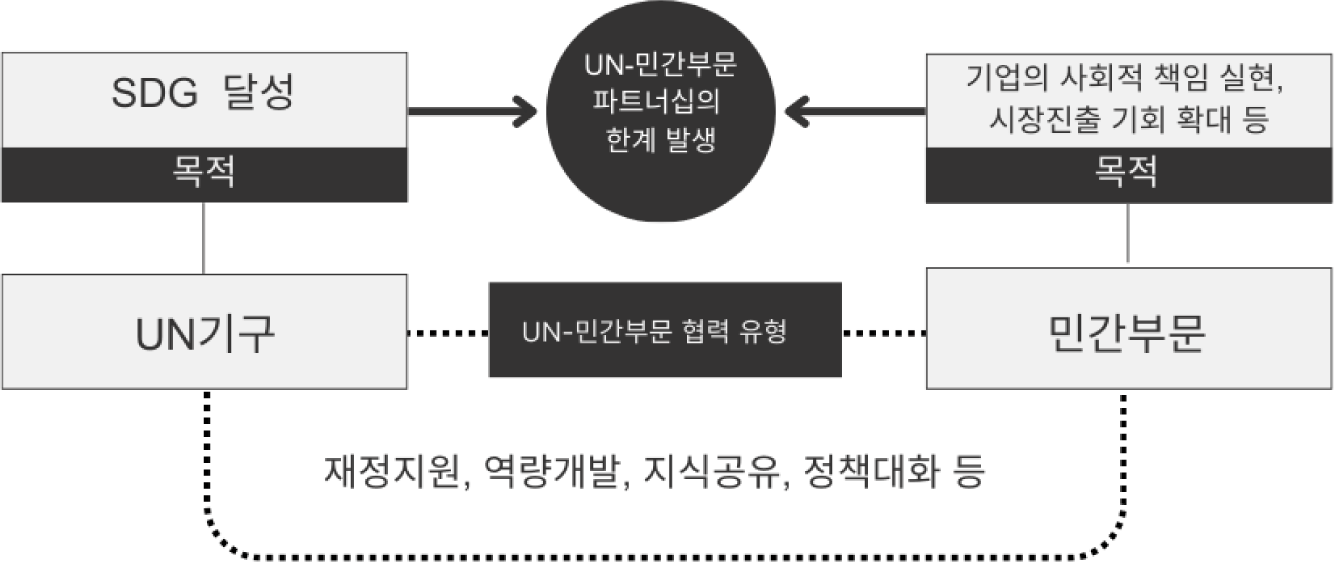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 소재 주요 UN 기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개별 UN 기구의 민간기업 파트너십 전략 및 사례들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UN 기구 내 민간기업 파트너십 담당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개발협력 사업에서 민간기업과의 협력 가능 영역 및 제한요소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 면담질문지1)를 활용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 현황, 추진체계, 한계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면담 개요는 <표 2>와 같다2).
| UN 기구 분야 | 면담 참여자 수 | 면담일 |
|---|---|---|
| 식량 | 3 | 2023. 04. 18. |
| 농업 | 2 | 2023. 05. 10. |
| 기후 | 1 | 2023. 05. 11. |
| 교육 | 2 | 2023. 05. 22. |
| 난민 | 1 | 2023. 06. 12. |
또한, 국제개발협력에서의 PSE 활성화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ODA 실행 정부부처, 민간기업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에는 총 18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표 3>).
| 날짜 | 2023년 7월 26일 |
| 시간 | 10시 30분~13시 |
| 참여 기관(참여자 수) | UN 기구(5), 정부(1), 민간기업(3), 국제개발협력 개인 컨설턴트(2) |
| 논의 내용 |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촉진 및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수집된 심층 면담 및 간담회 기록은 개방 코딩(open coding)을 통해 인터뷰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범주화 작업’을 거쳤다. 이를 통해 각 UN 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민간기업 참여 전략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개발협력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실제 사업 진행 중 나타나는 민간기업 파트너십 저해 요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향후 민간기업 파트너십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전략으로 취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단순 조달 시장 참여 또는 자금 지원 형태를 넘어, 한국 민간기업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 연구결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 민간기업의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협력 사업 참여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개발협력 환경 및 시스템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데 국한되거나, 기존 ODA 틀과 규정에 민간기업을 단순히 포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개발협력에서 민간기업 협력 제약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기업의 국내 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UN 기구의 민간 파트너십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SE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공적 개입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기업은 이익을 목표로 하는 기관임을 인정하고, 개발협력 사업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가 단순히 기업의 ESG 경영이나 CSR 실천에 그치지 않고, 유·무형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전문성과 재원을 개발협력 사업에 활용할 경우, 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적 혜택이 기업에 부여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개발협력 시장 내의 민간기업 참여를 기업의 책임이나 의무로 보는 시각이 많다.
또한, 한국의 경우, UN-민간기업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민간 부문의 비즈니스 가치 기반 개발협력 참여 모델을 고려함과 동시에 PSE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인 기반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더불어,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UN 기구 측에서도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현장에서도 기업과의 협력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저희(UN 기구)도 기업의 생리를 알아가는 스터디 자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서로) 속도가 달라요. 기업의 책임,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희도 기업의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우리가 생각하는 보고시스템에 끼워 맞추다 보니 서로 매칭이 잘 안되어요.” (2023. 6. 12. UN 기구 담당자 면담 중 발언)
“현장직원들의 마인드셋도 기업들과 같이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족하여,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본부의 민간기업 협력 담당자를 현지에 파견하기도 해요” (2023.06.12. UN 기구 담당자 면담 중 발언)
더불어, 기업 또한 각 UN 기구의 구조에 따라 민간과의 협업 형태와 접근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예산 체계는 회원국들의 정규 분담금(assessed contribution)으로 편성된 정규예산과,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 등으로 편성된 비정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구별 예산 체계에 따라 기업 협력 전략 및 방안이 다를 뿐만 아니라, 기구의 분류(산하 또는 전문기구)에 따라 민간기업 협력 방안의 접근방식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저희는 프라이빗 섹터를 명확한 재원의 파트너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에서 역량 배양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 이전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또는 심포지엄에 전문가들이 같이 참석해서 한국의 경험 및 기술을 공개해 주는 방향으로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 (2023.05.10. UN 기구 담당자 면담 중 발언)
이처럼 UN 내 기구별로 민간기업 협력에 대한 우선순위와 니즈가 상이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역시 UN 협력사업 방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UN 기구는 기업의 근본적인 생태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고, 기업 또한 UN 기구의 협력방식에 대한 인지가 낮은 실정이다. 민간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고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은 개발협력 사업 내 민간기업 참여의 장애요소로 작동할 수 있으며, 반대로 시장 중심의 민간기업의 개발협력사업 참여는 UN 기구의 공공성을 저해하여 UN이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 더욱이, 민간기업은 파트너십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을 고려하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파트너십에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윤을 내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민간기업은, 개발협력 참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UN 기구와의 심층면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내용은 양측의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현재는 서로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파트너십에 대한 협의를 진척시킬 수 있는 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순간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면담에 참여한 UN 기구 관계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특정 회사에 대한 조사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민간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였다.
“사실은 민간기업과 국제기구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제기구들 내에서 차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기업의) 이해도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같이 사업하고 싶어요’ 하는 식의 상황이 (오고 가고)…” (2023.05.10. UN 기구 담당자 발언)
“(민간기업과 협업하기 위해서) 회사에 대한 조사를 엄청 하는 거죠. …(중략)… 네트워킹도 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프로치도 하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에서 다보스포럼 같은 곳에 많이 갑니다. 거기에는 대기업 관계자들이 많이 오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으니까요. …(중략)… 국제기구는 기업의 자금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팀도 따로 있고, 항상 어필하지만 성사가 잘 안될 때도 많아요. (2023.04.18. UN 기구 담당자 발언)
이처럼 민간기업과의 협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양측의 정보가 누적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특히, 클라우드기반 정보교류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때에 협력 기관에 대한 정보 및 최신 동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 교류 플랫폼은 UN 기구와 기업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이 데이터가 누적되어 추후 협업의 기초가 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커넥트포털(connect portal)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가 농업 및 식량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UN 기구가 수행 중인 다양한 사업에 대한 실무적 정보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기업 및 전문가들 간에 소통하고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특히 FAO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워크샵, 회의 등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경우 관심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국제기구 사업의 최신 동향에 대해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이와 함께 한국 기업에 대한 UN 기구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국내, 특히 중소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 한국 중소기업이나 소셜벤처에 대한 UN 기구의 이해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명성과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기적인 정보 교류의 장 또한 요구된다.
“국제기구와 민간기업이 주기적으로 다양한 주제로 1년에 두 차례 정도 이야기하는 장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야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요.” (2023. 6. 12. UN 기구 담당자 발언)
“국내 기업과 국제기구를 연결해 주는 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건너건너 순간적인 요구에 따라 컨택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미팅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교류에 장이 있다면 민간도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2023. 7. 26. 간담회에서 UN 기구 관계자 발언)
이처럼 UN 기구와 민간기업의 협력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논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의 장은 UN 기구와 민간이 각자의 태생적 차이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서로의 요구를 이해하여 수요와 공급을 맞춰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정보 교류를 통해 실제 협력이 가능한 파트너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구와 학계, 민간기업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여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 무작위의 네트워킹의 장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 협력 구축을 위해 우선순위와 주제를 설정한 전문적인 기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 단계에서 주제를 ESG, 환경 등 관련된 주제로 좁게 설정하여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3. 7. 26. 간담회에서 UN 기구 담당자 발언)
이러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은 기업과 UN 기구가 사전에 우선순위와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강점과 추구하는 목적에 기반한 사업 기획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킹의 장을 통해 국제기구-민간기업 협력 사업이 기획되기 전 단계에서 사전 협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제기구와 민긴기업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을 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 정보교류를 위한 전시나 페어의 형태가 아닌 전문적인 기획이 필수적이다. 정기적으로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되, 특정 주제를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정 기술을 이해하고, 사업의 기획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 영역에서 국제기구와 민간기업의 장기적 협력 방안 구축 방안’이라는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주제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민간기업들을 초청하여 기업과 국제기구가 서로 어떠한 조건, 기술 등을 원하는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분석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UN 기구 담당자와의 면담 및 간담회 실시 결과, 민간기업의 규모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전문 기구(technical agency)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UN 기구의 경우, 민간기업과의 협력에서 재원 조달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과의 기술 협력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원 조달을 목표로 했다고 생각한다면 대기업을 더 중심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어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제일 빨리 움직이는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중략)… 예를 들어, 스타트업들이랑 협력을 같이 해서 그들의 최신 기술을 전수해주고, 또한 개발도상국 파트너에 역량 강화를 해준다던지 …(중략)…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기관을 웰컴하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 5. 10. UN 기구 담당자 면담 중 발언)
이렇듯 UN 내 중소기업과의 기술 협력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자원 및 네트워크 등으로 인해 개발협력 사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신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선정하여 실제 개발협력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중개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을 강조되었다.
“(저희 기구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지원하면 선정하여 시드머니를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서 채택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저희 국제기구 사업에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없어서 일종의 중개센터 같은 곳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제품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국제기구 입장에서도 편하죠.” (2023. 4. 18. UN 기구 담당자 면담 중 발언)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UN과 같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기술 협력이 더욱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가 개발협력 사업을 설계할 때,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이나 제품을 사업 기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함께 R&D 사업 이후 이것이 지속되려면 또한 top-down 방식의 시장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정경쟁법과 같은 여러 이슈로 특정 업체를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특히 국제기구에서 특정 제품이나 기업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3. 7. 26. 간담회에서 정부부처 관계자 발언)
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관점에서 개발협력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 이후 CSR은 단순히 기업의 이윤 추구나 이익 재분배를 넘어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 공동체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경영방침이나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공유 가치(shared value)를 실현할 수 있다는 담론이 주를 이루었다(김효정, 2022). CSR은 점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었으며, 최근에는 CSR을 넘어서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ESG 경영 실천을 위해 개발협력에 참여를 강조하는 것으로 담론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부처에서 추구하는 협력방식은 개발협력 사업의 기획이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bottom-up’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대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개발협력 참여 기회가 점차 제한되고 있다. 한 예로, 기존에 기업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같은 내용의 사업을 2차, 3차 사업으로 확장할 경우, 이는 신규 사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다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현재의 개발협력 사업 설계방식은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협력 가능성을 더욱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 부처 및 민간기업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탑다운 방식의 민간기업 참여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대기업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현재 많은 대기업이 ESG, CSV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민관협력 프로그램 상에서는 bottom-up 형식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기업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top-down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Bottom-up 형식의 포트폴리오 구축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수용에는 좋지만, 사업의 양상이 너무 다변화되면서 그 안에서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전혀 구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민간기업 협력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에서 장기적, 전략적인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2023. 7. 26. 간담회에서 정부부처 관계자 발언)
특히, 대기업의 경우, 국제기구 또는 정부와 협력하여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기존 방식처럼 매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보다는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해외로 확장하거나, 사업의 깊이를 더해 개발협력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수도 있다. 현재의 개발협력 생태계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한, 대기업의 개발협력 사업 참여는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치기 쉽고, 기업 측에서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대기업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해 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임벨류가 있는 정부 기관과 대외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시 공모신청을 하고 선정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나 바라보는 시선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023. 7. 26. 간담회에서 민간기업 관계자 발언)
이처럼 기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 정부에 기대하는 지원의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형 및 특성별 지원 전략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중견 기업, 벤처 및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진출 경험과 이해도가 낮을 수 있으며 재정적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반면, 대기업은 UN 기구와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성과를 공동 관리하며, 이를 기업 이미지 제고와 홍보, 나아가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 분야, 개발도상국 현지 상황에 따라, 파트너십의 목적과 기대하는 지원이 달라지므로, 민간 부문 참여 방안도 유형 및 특성별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개발협력 사업의 설계 방식은 정부 부처가 사업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협력국과의 기획 및 협의를 통해 사업의 전체적인 틀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민간의 자문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까지 UN 기구와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개발협력사업은 민간기업이 UN에 재정 지원을 하거나, UN에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 설계 단계에서 기업이 단순히 기술, 제품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Provider’ 형태로만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민간기업이 지속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민간기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원국의 수요 및 개발 필요에 부합하고 사업 효과성을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 중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난민 지원 등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협력 사업의 문턱이 높아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민간기업은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면서, 개도국 시장 진출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관계부처합동, 2022). 또한, 개발도상국 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의 인지도 및 이미지 개선을 통해 ESG 등 비재무적 평가가치를 높이며, 동시에 잠재적 구매자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관계부처합동, 2022).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개발 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WFP(World Food Program)에서는 정부와 같은 제3자가 사업 기획단계부터 함께 개입하여, 협력국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정부-민간-국제기구가 얼라이언스의 형태로 협력하기도 한다. 기업과 국제기구가 1:1로 협업하는 방식은 기업의 자금지원의 형태의 협력에만 머무를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제별 접근(thematic approach) 방식을 취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각 주체별로 강점이 있는 부분에서 전문성을 제공하고, 보다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정책을 개발하고, 기업은 협력국 문제 해결에 기여가능한 기술을 제공하고, UN 기구는 사업의 코디네이션을 담당하여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협력 방식은 다자간의 합의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이 기술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협력하여 사업의 목표 달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진입장벽은 낮아졌으나, 기획부터 실행 및 종료 단계까지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여전히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 민간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 CTS) 또는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의 경우 최초의 기획은 기업 측에서 제안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세부 성과지표 설정이나 이행 및 관리 방식에 있어서 기업은 이미 정해진 규제나 조건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특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없게 된다. 또한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사업의 초점이 시장 발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반은 마련할 수 있지만, 이는 기업이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표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기술이나 제품이 사업 기획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참여 조건을 최소화하고, 혁신 제품이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 협력하여 개도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측에서도 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고충은 이해되지만, (민간기업들에게) 조금은 성글게, 목표에 부합하는 큰 틀에서의 조건을 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너무 촘촘하게 조건을 걸어버리면, 형식만을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특히 사업 초반에는, 기업이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경험치를 넓힐 수 있으려면 조건이 많이 없어야 해요. 저희의 (UN 기구) 전문성을 믿어주시되, 대신에 사업이 확대되면 조건을 조금씩 붙여나가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 6. 12. UN 기구 면담 중 발언)
특히, 소셜벤처나 중소기업의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및 기술 가운데, 혁신성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주요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기술적 솔루션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규모의 특성상 재원 유동성의 한계가 있으며, 국내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업하는 구조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는 민간기업과의 ‘공동 설계’가 사업의 일정 부분에 대해 특정 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정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이나 혁신적인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개발협력 시행기관과 공동기획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기업이 보유한 제품력 및 혁신성이 협력국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개발협력 사업 기획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UN 기구 또는 개발협력컨설팅 기관과 같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는 민간기업의 명확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UN이 기업과 함께 사업을 기획할 때는 기업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사업의 일부 요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민간기업은 기업의 재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참여하지만, 이에 따른 충분한 유무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하며, UN 기구 또한 기업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기업과 함께 일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만 민간기업과 UN 기구 양측이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기존과 같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국제기구가 전반적인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수행 기관이 민간기업이 되는 그림은 저희 측이 원하는 그림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업 실행(implementation)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기업이 개발협력사업을 이행하는 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3. 5. 11. UN 기구 담당자 면담 중 발언)
무엇보다도 기업의 개발협력 사업이 조달시장 참여 중심인 현 상황에서 기업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협력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개발협력사업에서 목표로 하는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제시한 UN 기구 (또는 다양한 개발협력사업 주체들)와 민간기업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통해 민간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이 개발도상국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SDGs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협력사업이 목표로 하는 성과와 부합하였을 때에는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해당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사업의 기획을 같이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UN-민간 부문 협력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개발협력사업 내에서 PSE 제약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간기업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있어 민간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다양한 개발협력 시행기관들의 수요는 분명 존재하지만, 각 주체의 수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 기획 및 실행까지 도출하는 사례는 여전히 소수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UN 기구 면담 및 간담회 논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기업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며, 민간기업 또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민간기업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시장 확대, 즉 이윤 창출에 있으며, 현재 개발협력 생태계는 이러한 민간의 주요 관심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이윤 추구 중심의 기업의 개발협력 사업 참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개발협력분야에서 PSE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측의 수요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정보 교류의 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네트워킹과 관련한 사항은 심층 면담 시 UN 및 민간 양측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제시된 내용으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SE를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정보 플랫폼 및 KOICA의 민간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 매핑(mapping)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수행 주체들과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플랫폼 구축과 더불어 주요 관계자들이 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또한 협업 환경 조성에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 민간기업을 초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KOICA와 같은 정부 중개기관이 정기적인 간담회 및 설명회와 같은 네트워킹의 장을 개최하여 민간기업이 보유한 재원이나 기술을 공유하고, 국제기구의 현장 이해와 브랜드 파워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업 인큐베이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정보 교류의 장은 연혁이 짧고 혁신 기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더욱 중요하다. 네트워킹의 장은 단순 정보교류를 위한 전시나 박람회의 형태가 아니라, 전문적인 기획을 기반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주제를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민간기업이 보유한 특수 기술을 이해하고, 사업의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현재 정부가 강조하는 ‘기업협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체계’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정부가 양 이해관계자를 중계하고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 내 민간기업 참여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개발협력 사업 내에서 민간기업의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상이한 요구사항에 맞춘 긴밀한 협력전략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기술 도입 및 변화에 있어 상대적으로 민첩한 편으로, 개발협력사업에서 필요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적합할 수 있지만, 한정된 자원과 네트워크로 인해 개발협력사업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반면, 대기업은 ESG 경영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현재 대기업의 개발협력사업 참여 방식은 주로 자금 지원에 치우쳐 있어, 장기적인 ESG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가 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구체화하여 민간기업 개발 협력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업의 규모, 분야, 협력국의 상황에 따라 파트너십 목적과 기대 수준이 다른 점을 유념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되는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발협력사업의 기획 및 실행단계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로 인하여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개발 수요 및 필요를 고려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품이나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개발협력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이 단순 사업제안을 먼저 하는 것을 넘어서 사업을 실행하고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특장점을 살려 기존 국별협력사업과는 차별화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업 설계부터 실행까지 기존 개발협력사업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의 주체별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UN 기구와 기업 간 개발협력사업 참여 동기와 실행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실제 담당자 심층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주체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면담 결과 국제개발협력 내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같은 제3자의 개입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최근 우리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등을 통해 기업과의 민관협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기업협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2). 국제기구와 민간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익(win-win)이 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정부는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 등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이 단순 입찰을 통해 ODA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협력의 틀 내에서 기업의 상업적 이익 추구를 보장하면서도(김은주·이도석, 2022), 민간 부문 참여 확대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지원 및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PSE가 더욱 활성화되고, 개발협력 생태계 기반 조성이 강화될 수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의미 있는 발견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을 갖는다. 분석 대상을 한국 소재 UN 기구에 한정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 및 제언을 국제적 수준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UN 기구들 또한 본부에서 수립한 글로벌 PSE 전략을 준수하고 있어, 글로벌 담화의 흐름에서 완전히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 부합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으나 국내와 유사한 논의 단계에 있는 신흥 공여국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