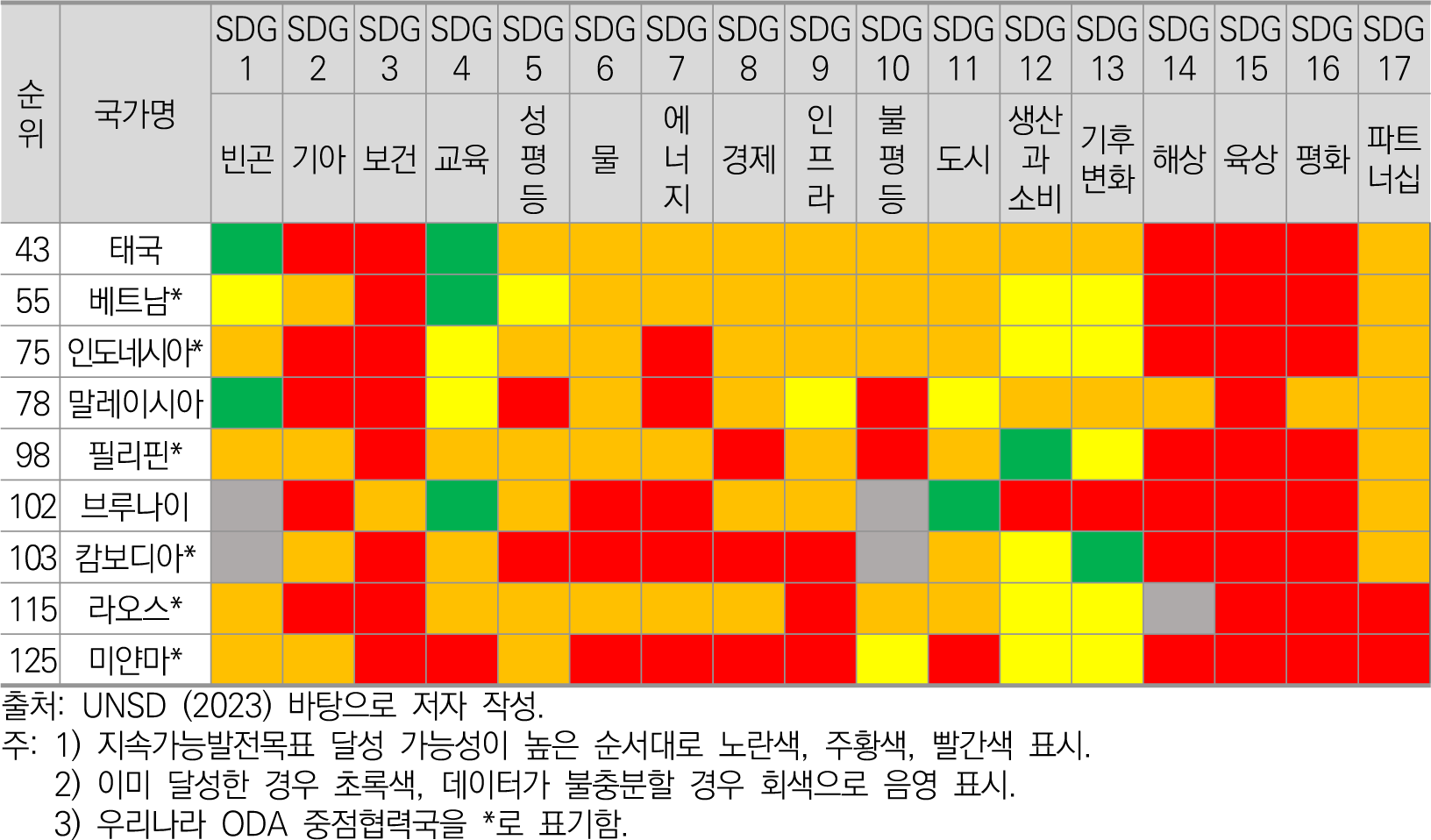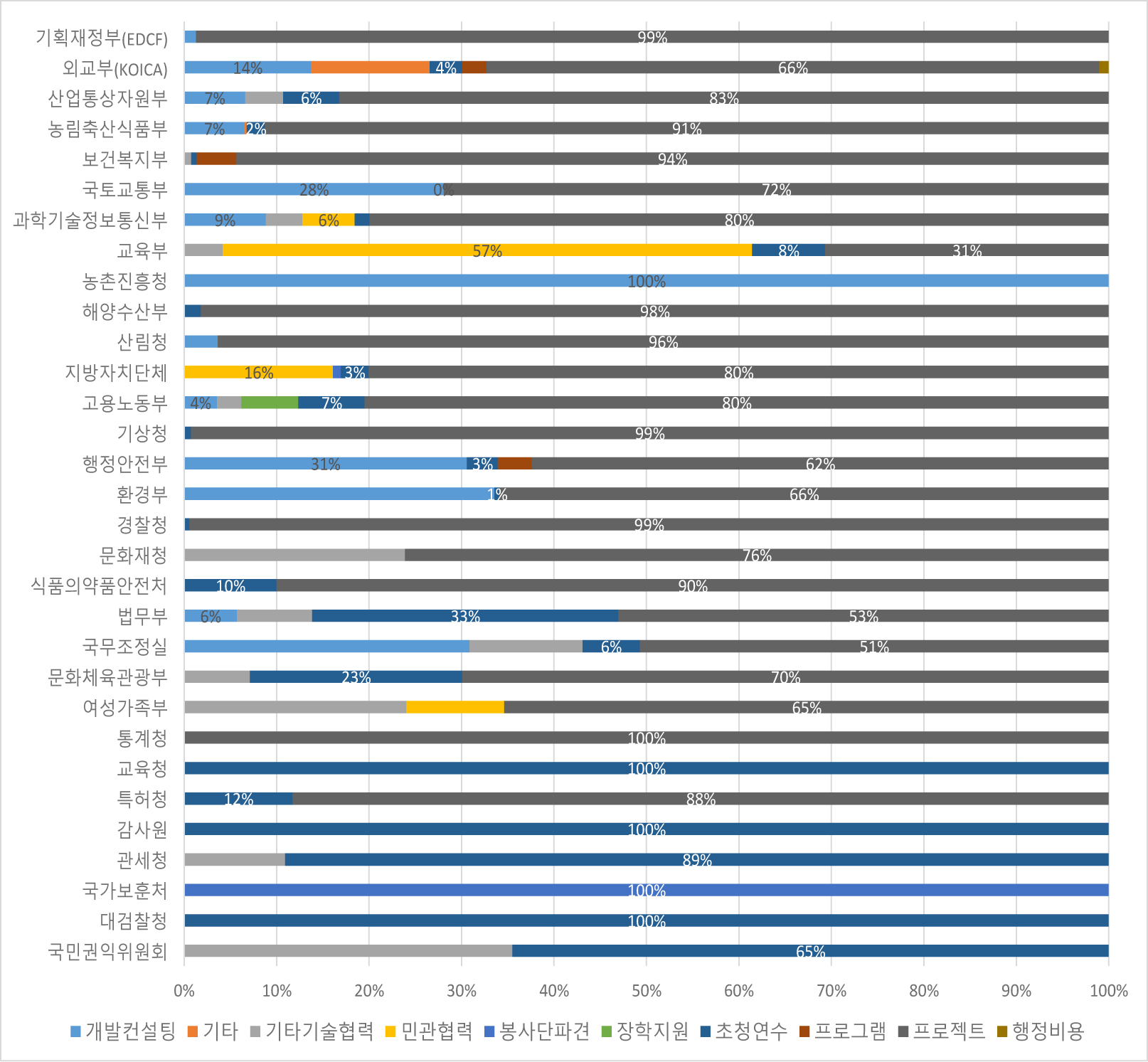Ⅰ. 서론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90년대 초반 이후 역내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해 왔고,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베트남,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국가들을 신규회원국으로 가입시켜 ‘ASEAN 10’을 실현하였다(권율, 2004: 13-14). 그러나 동남아시장의 성장잠재력과 역내 시장통합의 조기실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는 EU(European Union)와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고, 남-남협력체라는 구조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AFTA는 개발도상국간의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역내기술 및 자본 부족에 따라 통합체내의 경제적 자립이나 내부결속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지역통합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위해 아세안의 역내통합을 심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왔으며(권율, 2013: 106-108), 한국과는 1989년 대화 관계를 수립한 후 2010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금년 10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ship, CSP)’로 격상하게 되었다. 한국과 아세안의 CSP 체결은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아세안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국별로 경제규모와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하고, 사회 문화,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인구, 면적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세안 지역통합을 심화시키려면 역내 개발격차 완화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역내 저개발국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격차 완화사업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개발재원이 부족한 아세안 회원국들로서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요청하고 역내 협력프로그램을 확대해 왔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가열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권율, 2022b, 2023a), 코로나19 확산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개발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27개 중점협력국 중에서 동남아 국가 6개국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하여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따라서 본고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ODA 전략을 수립하고, 보다 효과적인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수행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권형 원조체제하에서 수원국과의 정책협의가 미흡하고 현지참여가 부족한 공여기관 주도의 사업수행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지원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주도 개발 방식의 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아세안의 경제현황과 개발격차
동남아시아는 1980년대 후반 외자 주도의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생산기반을 확대하면서 국제적으로 유망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급부상하였다. 글로벌 생산체제하에서 대외지향적 개발전략(outward-oriented development strategy)의 주요 사례로 여겨지고 있는 동남아의 경제발전은 일본과 아시아 신흥공업경제(Asian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ANIEs)에 이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연계되면서 ‘고도성장지역(High Performing Asian Economies, HPAEs)’이라 주목을 받은 바 있다(권율 외, 2021b). 특히 1980년대 말 인도차이나 국가들이 개혁·개방체제로 전환하면서 투자 여건이 급격히 개선됨에 따라 동남아지역은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급속히 부상하였고, 외국인 투자자본이 역내로 대거 유입되면서 안정적인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총인구가 6.7억 명이고,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3조 6,21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표 1>). ASEAN의 교역 규모는 3조 8,462억 달러로 GDP 대비 대외의존도가 106%에 달한다. 동남아 주요국이 외자주도형 수출확대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동남아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2017년 157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226억 달러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UNCTAD, 2023). 그러나 국제분업체제 하에서 다국적기업의 동남아 진출은 수입대체형 투자보다는 수출지향적 직접투자에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구조적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기술과 자본력이 취약한 현지기업의 경우 외자기업의 하청 생산에 주력하고 있어 산업경쟁력이 낮고, 중국경제 부상으로 인한 국제분업체제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여 금융위기 이후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수입의존적 경제구조가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동남아 각국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부품산업 육성, 개발 및 설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간재산업(supporting industry)이 낙후되고 숙련노동자가 부족하다는 등의 한계로 산업발전과 구조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외국자본과 외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수출과 투자의 동시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과 산업발전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소재·부품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선발공업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혁신주도형 경제발전 전략과 신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및 기술혁신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중진국함정(middle income trap)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봉쇄조치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가마다 경제둔화 편차도 크고 지역별로 경제·사회적 불안정성도 심화되었다(권율 2023a. 이정환 2024).
그동안 아세안 회원국들은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고, 빈부격차, 고용, 인력개발, 공업화,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개발과제에 직면해 왔다(ASEAN Secretariat, 2022). 90년대 중반 이후 역내 저개발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Cambodia, Lao PDR, Myanmar, Vietnam, CLMV)이 차례로 아세안에 가입하면서 역내 개발격차 문제가 지역통합의 핵심 이슈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국별 1인당 GDP(2022년)를 비교해 보면 싱가포르가 82,794달러인데 최저개발국인 미얀마는 1,093달러여서 소득격차가 너무 크고, 라오스와 캄보디아도 2천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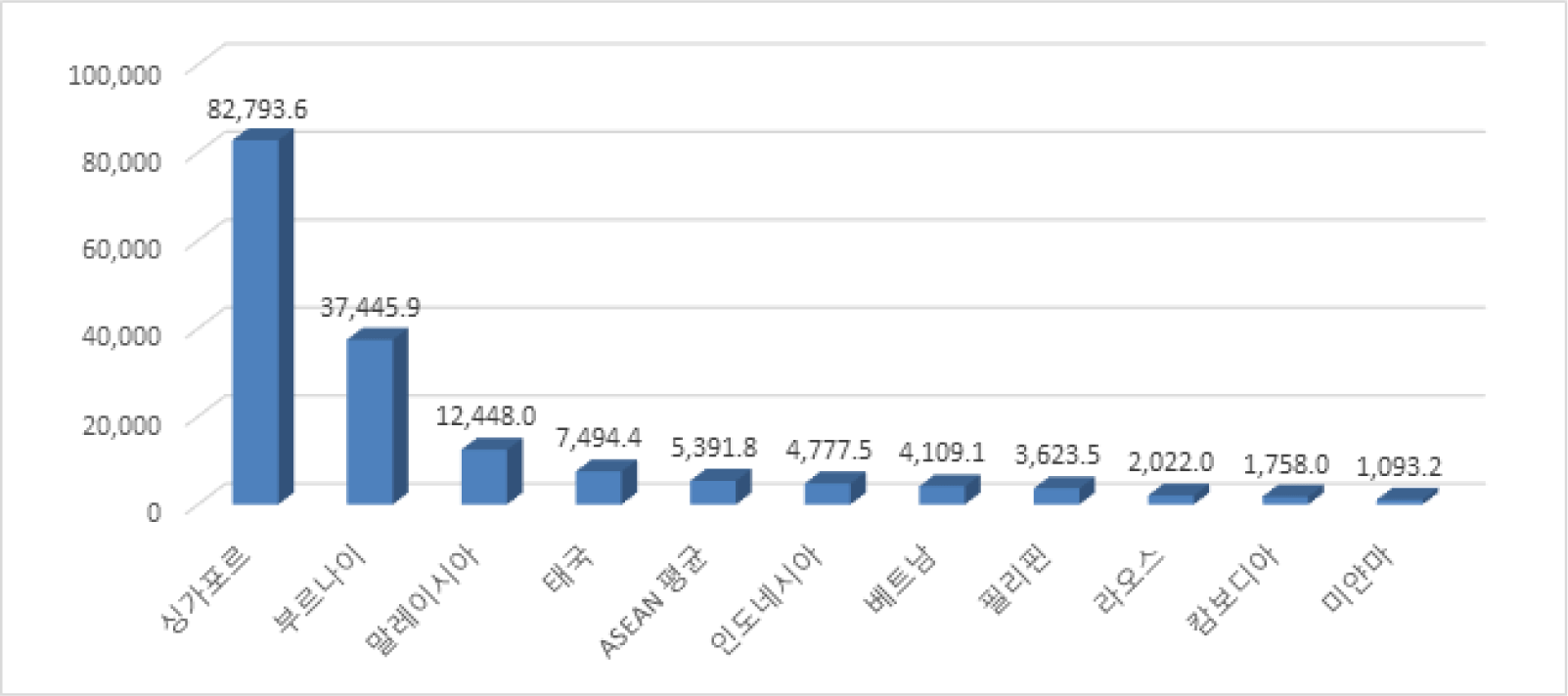
아세안 후발가입국인 CLMV 국가는 체제전환국으로서 전형적인 농업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 개발 초기단계에서 공업화를 추진해 온 베트남의 경우 2008년 저소득국에서 중소득국으로 진입하여 2022년 1인당 GDP가 4,109 달러를 기록하였다. 필리핀은 여전히 하위 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LMICs)에 머물러 있고, 인도네시아는 최근 자원개발과 연계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1인당 GDP가 4,778달러를 기록하여 상위 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UMICs)으로 진입하였지만, 아직 빈부격차가 심하고, 고용 확대 및 인력개발, 공업화 및 인프라 확충 등 많은 개발과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ASEAN 주요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1) 동남아시아 국가 중 소득수준이 높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SDGs 이행 정도가 양호한 편이나 최저개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SDGs 이행 순위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권율 외, 2021a). 주요 분야별 목표를 살펴보면, SDG2(빈곤)와 SDG3(보건)의 경우 목표를 달성한 국가가 하나도 없으며, 대부분 이행 정도가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수자원, 에너지, 경제, 인프라 등의 목표 역시 달성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거나 위험한 수준이어서 2030년까지 SDGs 달성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SDG11인 도시의 경우 필리핀, 미얀마 등의 경우 SDGs 이행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표 2>).
기후변화의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행 달성 또는 주의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목표에 비해 양호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경제개발과 공업화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후변화 관련 지표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를 악화시키지 않는 친환경적 생산기술 및 생산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해상 및 육상 생태계에 대한 목표 미달성도가 높기 때문에 환경분야 협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Ⅲ. 한 · 아세안 협력관계와 개발협력 추진성과
그동안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다. 한국은 1989년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후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매년 아세안의장국이 개최하는 아세안 관련 협의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이재현, 2023). 대화상대국이 참여하는 아세안의 연례 정상회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와 아세안 플러스(ASEAN+1) 양자회의이지만, 대화상대국이 자국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해 아세안과의 양자협력을 강화를 모색해 왔다.
정부는 2009년(제주), 2014년(부산), 2019년(부산) 3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해 왔다. 2019년 제3차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한-아세안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의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단순히 경제외교에서 탈피하여 지역가치를 공유하고 역내 개발격차 완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협력기반을 강화하였다.
특히 제3차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메콩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메콩 정상회의는 메콩 소지역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한강-메콩강 선언’과 7대 우선 협력 분야는 한국의 대메콩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고, 한국과 메콩5개국 정상들은 2020년 제2차 회의(화상 개최)에서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는 2020년 한-아세안이 합의한 ‘한-아세안 실행계획(ASEAN-Republic of Korea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Joint Vision Statement for Peace, Prosperity and Partnership 2021-2025)’의 토대가 되었으며, 이후 아세안의장국이 개최하는 연례 정상회의를 통해 지속·발전되고 있다(<표 3>). 신남방정책의 후속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도 2019년 회의의 성과를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권율 외, 2024).
출처: 권율 외 (2024: 253).
금년 10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25차 정상회의에서는 2010년 한·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만에 11개 대화 상대국 중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에 이어서 6번째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CSP)를 수립하였다. CSP란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으로서 ‘한-아세안 연대구상’ 차원에서 2022년 발표된 기존 사업들과 아세안의 요청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ODA 사업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조만간 정부는 아세안 중시외교 정책에 따라 CSP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120대 협력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촉진하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최인아, 2024).
그동안 아세안 중시외교와 대외전략에 따라 정부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와 양자·다자 고위급 회의 등의 주요 계기와 연계하여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등 6개국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정하여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하고 국별로 중점협력분야를 설정하여 국별 양자원조 예산의 70% 이상을 배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ODA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한 바 있으나 2018년 4억 5,789만 달러에서 2022년에는 6억 575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권율, 2022a). 지난 5년간(2018∼2022) 아세안지역에 대한 전체 ODA 지원 규모는 27억 3,639만 달러에 달한다. 그 중에서 베트남에 대한 지원규모가 6억 3,292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수원국이고, 그 뒤를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순이다. 상위 중소득국으로 일반협력국인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지원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표 4>).
출처: 권율 외(2023), OECD Stat(2024).
아세안 중점협력국 6개국을 대상으로 2017∼2021년간 무상사업의 주요 유형(예산확정액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상사업의 75.8%가 프로젝트형 사업에 해당하며 5년간의 지원액은 총 7,21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어서 개발컨설팅 17.1%(1,628억 원), 연수사업 3.6%(338억 원), 민관협력 1.7%(160억 원), 프로그램 1.0%(93억 원), 기타기술협력 0.8%(79억 원) 순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대부분 인프라 확충사업을 지원하는 유상원조를 제외할 경우 무상사업의 유형별 비중 추이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젝트형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강화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개발컨설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프로젝트는 2017년 64.6%에서 2021년 84.1%를 차지하였고, 개발컨설팅은 2017년 23.8%에서 2021년 10.4%로 크게 감소하였다. 사업유형 중 프로그램과 기타기술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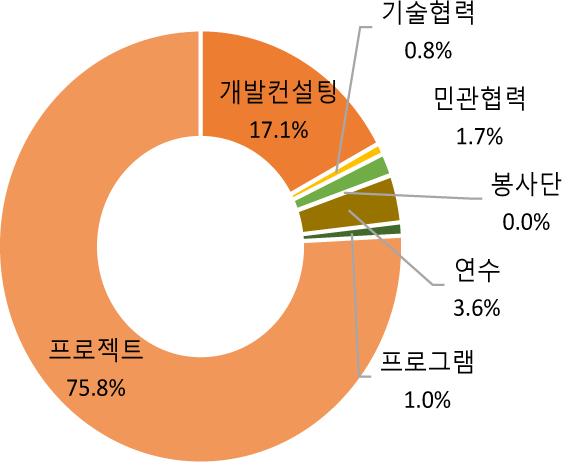
아세안 중점협력국 6개국을 대상으로 ODA 시행기관별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2017∼2021년간 총 31개의 기관이 ASEAN 지역에 대한 ODA 사업을 추진하였다. 시행기관별 예산 규모 순으로 보면, 기획재정부·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가 2조 1,033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규모가 가장 컸으며, 외교부·KOICA는 5,3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이 각각 617억 원, 527억 원으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주관기관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기관별 사업 건수는 외교부·KOICA가 483건, 기획재정부·EDCF가 391건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양 기관을 제외한 29개 시행기관은 평균 23.7건의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1년 기간중 기획재정부·EDCF와 외교부·KOICA는 각각 총 양자원조 예산의 35.6%, 11.1%를 아세안 중점협력국에 대한 ODA로 배분하였다.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한 기관 중 양자 ODA 예산 규모 대비 아세안 중점협력국 6개국에 대한 ODA 예산비중이 높은 시행기관은 기상청(57.1%), 고용노동부(43.3%), 국토교통부(40.0%) 등이다.
출처: 권율(2022a: 17) 재인용.
아세안 중점협력국 6개국을 대상으로 ODA 시행기관별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ODA 예산확정액 기준으로 대부분의 시행기관이 프로젝트 유형의 사업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EDCF,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이 전체 사업의 90% 이상을 프로젝트 유형으로 수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개발컨설팅의 비중이 100%를 차지하고, 교육부는 민관협력의 비중이 57.3%로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에 대검찰청, 감사원, 교육청은 초청연수 유형의 비중이 100%, 국가보훈처는 봉사단 파견비중이 100%로 예산 규모가 작은 시행기관은 기술협력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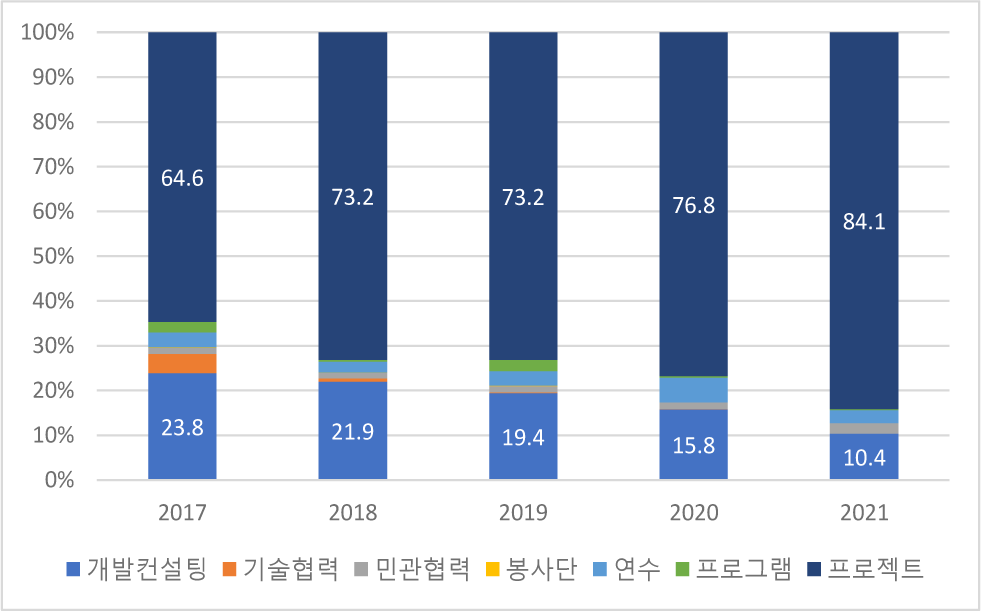
Ⅳ. 한 · 아세안 개발협력 개선과제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와 긴축재정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 세계 10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ODA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2) 한·아세안 협력관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규모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ODA 규모가 확대에 따라 집행관리 강화와 ODA 성과 제고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다수기관에 산재한 ODA 사업의 통합적·효율적 관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원조예산의 급속한 확대로 집행부진·성과미흡 사업 등을 정비하여 유·무상 연계 고도화 등 다부처 협업 ODA를 확대하고, 개도국 인프라 수요에 맞춘 대형사업 발굴 확대를 위해 패키지사업 발굴을 강화하고 민간재원과 연계하여 사업의 대형화도 필요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공여기관들은 하향식(top-down) 사업 기획을 통해 전략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지역과 각 국가 단위에서 주요 개발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공여국은 지역별 개발협력 전략을 통해 보건, 환경, 인권, 경제통합 등 지역내 다국가 협력이 필요한 개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전략의 중점지원 분야는 국별전략에서 강조하는 교육, 교통, 산업, 농업 등의 세부 분야별 전략보다는 크로스커팅 이슈와 공동협력이 필요한 거시적 정책분야를 제시하고 있는데, 경제회복, 보건안보, 환경과 기후변화 등이 지역차원의 개발협력 전략에서 취약국가를 중심으로 중점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권율 외, 2019).
따라서 한·아세안 협력관계의 심화와 발전에 따라 다수의 개별사업이 아닌 지역차원의 프로그램 사업과 전략적 패키지 사업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아세안 중시외교를 기반으로 중점협력대상국 중심의 국가협력전략(CPS)을 통해 다수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행기관중심의 상향식 사업발굴과 선정으로 전략적 사업 추진에 한계가 많았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양자지원을 포함하여 아세안지역 공동체와 통합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다자기구 및 국제이니셔티브 참여, 하향식 전략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방식을 보다 고도화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사업 추진체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개별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식을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 정책 수립을 통해 하향식(top-down)으로 전략적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 추진 전략 및 이행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권율 외, 2021b).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국가협력전략(CPS)는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개발여건을 조사하고, 국내 ODA 시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점협력분야를 선정하는 수준이어서 수원국 개발수요(need)에 기반한 협력프로그램과 전략적 협력사업 도출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CPS 초안이 완성되면 수원국에 중장기 협력방향을 제시하고 수원국 개발수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주요 요청사업(request list)을 협의하기 위한 국별 정책대화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 비교우위와 강점을 고려한 지원가능사업(offer list) 제시하여 지원수단별로 적정 유·무상 협력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필요시 부처별 요청사업이 사전협의되어야 전략사업과 중점협력분야별 지원가능사업을 취합하여 수원국에 통보하고 관련 소요예산을 추산하여 다년도 예산계획(budget plan)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세안 중점협력국에 대한 정책대화를 통해 주요 협력사업 규모 및 지원한도를 협의·약속(commit)하고, CPS 수립과 함께 예시적인 사업목록(indicative list) 작성하여 다년도 예산을 위한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주도의 전략사업, 주관기관의 협력프로그램,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간 사전협의사업으로서 n-2 예비검토제를 면제하는 신속승인제(fast track)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 ODA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 제대로 된 현장 조사를 통해 계획되어야 하나, 아세안 주요국에서 수행되는 ODA 사업의 경우 주요 공여국이나 국제기구와 같은 철저한 현지 조사와 사전기획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년도 예산체제하에서 본부중심의 운영방식을 벗어나기 어렵고 정부부처사업이나 연계사업 추진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중심의 사업추진체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사업방식관련 수원국측 평가는 현지 수요대응, 사업관리 및 효과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애로사항으로 한국의 ODA 사업이 공여국 위주(donor driven)로 추진되고 복잡한 절차와 비현실적인 일정 등으로 현지주도 개발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권율 외, 2023: 355-358). 현재 한국의 ODA 사업은 n-2년 체계로 실제 발굴에서 시행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소요되고, 정책방향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가 경직되어 있고, 사업승인 및 추진절차가 복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의사결정 단계도 복잡하여 현지의 사업참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도 불충분하여 지속가능성이 낮고, 프로젝트 사업비중 확대로 재정이 취약한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은 최저개발국에 대해서는 후속지원 및 사후관리 역량 개선, 후속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도 적정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